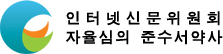기벌포영화관 영화사업팀장 윤혜숙
그리스 신화에서 ‘판도라’는 불을 얻은 인간을 벌하기 위해서 제우스가 온갖 불행을 가두어 둔 상자를 호기심 때문에 그 뚜껑을 연 인물이다. 절대 열어서는 안 되는, 또는 절대 열어져서는 안 되는 것을 지칭할 때 우리는 판도라의 상자라고 한다. 12월 7일 개봉한 영화 <판도라>는 절대 열어져서는 안 되는 원자력발전소가 지진으로 ‘열어’졌을 때 일어나는 재앙을 다룬 재난영화다. 그러나 영화가 다루는 재앙은 원자력발전소의 폭발로 인한 방사능 피폭보다는 이 엄청난 재난 앞에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는 무능한 관료들과 무조건 언론만 통제하라고 큰소리치는 정치인들에 포커스를 맞췄다.
<판도라>는 지진으로 인한 원자력발전소 폭발이라는 다소 생경한 소재가 최근 잇따른 지진으로 대한민국도 안전할 수 없다는 공감대와 일어날 수도 있다는 현실성을 담보로 관객들의 몰입도를 끌어 올렸으며 특히 청와대로 통하는 모든 언로(言路)를 차단시키는 실세 국무총리의 모습과 무능한 대통령의 모습은 지금 대한민국의 또 다른 현실을 보여주는 듯해서 이게 영화인지 현실인지 헷갈릴 정도다.
역대 최대 규모의 강진에 이어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로 이어지면서 방사능 유출에 대한 공포가 극에 치닫고 2차 폭발의 위험을 막기 위해 발전소 일용직원인 ‘‘재혁’과 동료들은 목숨을 걸고 다시 발전소 안으로 들어간다. 무고한 시민들이 위험에 처하고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이들을 구하는 것은 또 다른 평범한 시민들이다. ‘판도라’도 어쩔 수 없이 세월호 사고를 연상시킨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재난영화는 ‘세월호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곧 세월호에 대한 은유이며 잊지 않겠다는 우리의 다짐을 상기시킨다.
<판도라>의 시작은 실제 사건, 인물, 지역과 무관하며 실제 일어난 사건과 일치하더라도 그저 우연에 불과하다는 자막으로 시작하면서 영화 속 이야기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마지막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세계적으로 원전 건설을 줄이는 것과 반대로 대한민국은 오히려 늘리고 있다는 자막으로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고 끝맺는다. 이것이 <판도라>의 제작의도이며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한 바이지만 재난영화의 공식을 그대로 따른 뻔한 영화가 된 것이 조금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