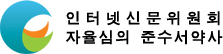9월 중순을 지나는데도, 더위는 서늘함에 자리를 내어주지를 않았다.
예년에는 이 정도 욕심을 부리고는 미련도 없이 물러서는 법이었는데, 올해에는 무엇이 아쉬운지 자리를 꿰차고 있었다.
예년에는 분명 가을이라 부르던 시기였는데, 올해에는 9월 중순을 여름이라고 해야 할지 가을이라고 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했다.
여름인가, 가을인가 긴가민가했던 생각을 다잡는 데에, 정확히는 여실히 뜨거움에도 가을이라고 해야 한다고 단정하는 데에 이번 보름이 큰 몫을 했다.
누군가는 가을의 정취를 새벽이슬에서 찾고, 누군가는 가을의 정취를 대낮에 물든 산에서 찾고, 누군가는 가을의 정취를 바다의 짠내나 석양에서 찾는다. 그리고 나는, 가을의 하늘에서 찾는다.
가을의 정체성은 하늘과 맞닿아있지 않은가. ‘하늘만 보면 가을인데…’라는 표현에 거리낌이 없을 만큼, 하늘로써 가을을 가늠하곤 한다.
밤낮없이 말갛고 높푸른 가을의 하늘.
한가위를 보낸 무렵에도 여전히 더웠다고는 해도, 밤공기와 바람은 꽤나 선선하여 가을의 초입인 듯했다.
눅진한 공기로 인해 장마철의 한때가 되살아나기도 했지만, 선선한 바람은 분명 가을로 흐르고 있었다.
무엇보다 가을과 통하는 그윽한 밤이었다. 깊은 밤하늘은 가을 하늘의 태를 가졌다. 그 밤의 틈을 비집는 휘영청 보름달도 유난히 수려해 가을의 정취를 한껏 자랑했다.
아주 간혹 구름 뒤 번개가 피어난 탓에 가을이 까무룩 잠드는 모양새가 있기는 했지만, 여름의 뾰로통한 시샘이라 여겨졌다.
가을, 무르익음의 계절. 익숙함과 무르익음을 비슷하다 느낄 수 있지만, 적어도 나에게 있어 익숙함과 무르익음은 다르다. 익숙함은 지루함과 연결되지만, 무르익음은 뿌듯함과 연결된다.
익숙함 안에서는 익숙한 과실이 나오거나, 시들어 떨어지거나, 또는 설익을 뿐이다. 하지만, 무르익음 안에서는 탐스러운 과실이 맺힌다.
다양한 군상들과 함께하며 익숙한 사람과 무르익은 사람의 경계를 고민했다.
익숙한 사람은 대개 연차와 경험으로 쌓아낸 일종의 스킬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일 처리를 잘하는 것, 매뉴얼에 대하여 통달하고 있는 것, 마감 시기를 단 한 번도 놓치지 않는 것, 타인의 업무 처리를 살펴주는 것, 목표한 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 융통성을 발휘하며 관계를 구축하는 것과 같은 부분이라고나 할까.
한편, 무르익은 사람도 더러 있다. (여전히 고민 중인 부분이지만, 아직까지 고민의 결과로는) 자신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람, 고마움과 미안함이라는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타인에게 부담은 주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한 무형의 사랑을 말로써 고백하여 진심을 전할 줄 아는 사람.
익숙한 사람에게는 지루함이 찾아온다.
하지만, 무르익는 사람은 지루할 겨를도 없다. 무르익는 나무는 투쟁하며 과육과 과즙을 얻어내고야 만다.
우리의 과실은 어떤 모양이고, 어떤 향이며 또 어떤 맛일까.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무르익음 속의 어떤 나무일 수 있을까.
여태껏의 날을 되짚어보고는 스스로의 노력을 치하하거나 노력을 다짐하는 계절이 시작되었다. 이 계절에 마음이 가는 이유는, 익숙함과 무르익음을 선보이는 만물(가령, 벼!)이 눈에 선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는, 인간인 나도 익숙함과 무르익음을 맞이하는 방법을 안다면 경이로운 자연과 함께 호흡할 수 있다는 자신이 붙기 때문이다.
한국민속대백과사전에서 한가위를 연중 으뜸인 명절이라 칭하는 것도, 계절의 이러한 미감 때문일 테다. 익어가는 시간 속에서, 익어가기 위하여 노력한 생명들을 보며 느끼며 경탄할 수 있는 때!
계절마다 떠오르는 시가 있다.
봄에는 정유경 시인의 <걸어>와 이산하 시인의 <나무>가, 여름에는 안희연 시인의 <열과>와 최지은 시인의 <한없이 고요한, 여름 다락>이, 겨울에는 강성은 시인의 <계면>과 이수동 시인의 <사랑가>가, 그리고 가을에는 박소란 시인의 <노래는 아무것도>와 김용택 시인의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가.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이 밤 너무 신나고 근사해요/내 마음에도 생전 처음 보는/환한 달이 떠오르고/산 아래 작은 마을이 그려집니다/간절한 이 그리움들을,/사무쳐 오는 이 연정들을/달빛에 실어/당신께 보냅니다” 높은 만큼 짙은 가을밤을 환히 가르는 달빛과 계절과 함께 익어가고야 만 발그레한 연정이 꼭 가을 아니겠는가.
이 글을 읽는 당신의 무르익음을 열원하고 있다고, 이 시를 빌려 고백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