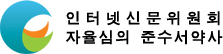‘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라고 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산 사람이 죽은 사람보다 낫다는 말이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할 점이 있다. 정말 어떤 경우에도 사는 것은 죽는 것보다 나을까? “A가 B보다 낫다”라는 명제는 비교명제다. 즉, 둘을 비교해서 더 나은 가치가 있음을 증명할 때, 이 명제는 참이 될 수 있다. 더 나은 가치가 없는데도 그래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다.
힘들더라도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설득할 양이라면, 차라리 담백하게 힘들어도 참으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말하는 본인도 가보지 못한 저승까지 끌어대서, 굳이 세상이 살만한 곳임을 증명하려고 억지를 쓸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삶의 충동은 누구에게나 가장 강한 충동이다. 하지만 이처럼 강한 충동이라도 도저히 충족할 수 없을 때, 사람은 죽음의 충동에 사로잡힌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 즉 자신의 죽음을 바라는 것이다. 결국 사람은 삶의 충동으로 쾌락을 얻을 수 없을 때 자신을 죽인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쓰던 에너지를 이제 자신을 죽이는데 사용한다. 이것이 바로 자살이다. 프로이트의 설명이다.
하지만,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흔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자살이란 행위의 밑바닥에는 삶을 원점으로 돌리고 싶은 충동이 있다. 결국 자살이란 “나 돌아갈래!”라는 절규요, 출발점으로 돌아가려는 몸부림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55명의 노인이 자살한다고 한다. 2015년 통계다. OECD국가의 평균 노인자살률의 3배라고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 아무 의미 없는 비교다. OECD는 그런 통계를 공식적으로 내지 않는다. 또 OECD의 다른 가입국의 평균 노인자살률보다 많으면 불행한 것이고, 평균보다 낮으면 행복하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숫자와 통계로 설명하는 합리적 사회의 맹점이다.
중요한 것은 매시간 2.2명의 노인이 죽는다는 통계적 숫자가 아니다. “살 맛”을 잃고 “죽을 맛”을 선택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실이 더 심각한 문제다. 삶의 의미를 잃은 노인이 줄을 서서 죽어가는 사회에서는 남은 사람도 결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을 중심한 서구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심리부검이라는 제도를 시행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지만, 죽은 자로 말하게 하는 것이다. 심리부검은 자살로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친구를 심층 면접해서 자살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다. 늦게나마 죽은 이의 마음을 헤아림으로써 또 다른 불행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다. 한 사람의 자살은 별이 지듯이, 한 생명의 소멸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한 개인의 자살은 그가 속한 사회 전체에 큰 파장을 남긴다. 남은 자들은 죄책감과 불안, 슬픔 등 다양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결국 죽은 자가 자살로 표현한 ‘죽음보다 더 괴로운 삶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은 같은 사회 환경 속에 사는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다. 이 수많은 자살자의 삶의 이야기가 통계상의 숫자에 파묻힐 때, 오늘의 불행은 내일,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라는 말이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 약발을 잃어버린 위로기 때문이다. 평생을 험난한 세파와 시달리면서, 자신의 노후를 염려할 겨를 없이 자녀와 가족, 부모만 생각하며 일해 온 노인들을 개똥밭에 구르게 만드는 사회는 더 이상 인간이 살 수 없는 사회기 때문이다.
이승이 저승보다 나은 곳이라고 말하려면, 늙었다는 이유로, 경쟁력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개똥밭에 구르는 일이 없도록 일으켜 세워주고, 보살피는 이웃이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산 사람이 개똥밭에 굴러도 무관심한 사회, 그것을 개인의 무능력이나 게으름으로만 여겨 정죄하는 사회는 더 이상 이승이 아니다. 이미 저승이며 산지옥이다. 이 점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