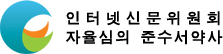'강석화 시인(한국예총 서천지회장)'의 전체기사
-

칼럼 [강석화의 소중한 이야기] JAZZ를 들으며
재즈에 관한 깊은 안목은 없지만 나는 가끔 재즈의 음률에 빠지곤 한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리듬 위에 펼쳐지는 현란한 애드립, 블루스의 애조 띤 음계에 아프리카의 분방하고 경쾌한 박자, 속삭이듯 때론 흐느끼듯 흘러가는 악기들의 저마다의 음색 그리고 허스키한 가수의 읊조림은 가슴을 적시며 흔들어댄다. 어느새 곡조를 따라 흥얼거리는 내 모습을 발견하곤 한다. 넓게 해석할 때, 세상의 모든 소리는 음악이고, 말은 노래이며 온갖 동작은 춤이 될 수 있다. 인류가 말로써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춤과 노래는 비롯되었다고 한다. 원시인류가 소리가 잘 울리는 통나무를 골라서 막대기로 두들기며 소리치고 껑충거리며 자신의 기쁨과 슬픔을 표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자. 우리가 음악을 듣고 춤추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음악과 춤이 원초적일수록 본질적이고 직접적인 메시지를 담는다. 현란하게 치장되고 고도로 비틀어진 현대음악은 난해함을 무기 삼아 듣는 이에게 감상의 선택을 강요한다. 각국의 전통적인 민속음악이나 민요는 타 민족에게도 쉽사리 공감되지만, 발전과 변혁을 거듭하며 마침내 첨단을 달리게 된 요즈음의 일부 음악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오랜 적응훈련이 아니면 가까이하기에 쉽지
- 강석화 시인(한국예총 서천지회장)
- 2026-01-26 21:21
-

칼럼 [강석화의 소중한 이야기] 사색의 곡괭이
사색은 자신과 세상의 너른 품을 헤아리는 독수리의 눈이요, 내면의 심연과 사물 뒤편을 들여다보는 현미경이다. 그로써 삶의 뿌리와 세상의 본질을 캐내는 지혜의 곡괭이다. 사색의 물길을 따라가다 보면, 복잡하게 얽힌 생각과 경험의 겹겹을 뚫고 들어가, 혼돈 속에 숨겨진 진실과 의미의 씨앗을 발견하게 된다. 사색은 물음표 하나에서 시작된다. 만약 사색이 숨겨진 보물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라면, 질문은 어둠을 밝히는 나침반이자 새벽 별과 같다. 질문이 없는 길은 눈 가린 아이처럼 제자리를 맴돌거나 엉뚱한 들판을 헤매게 만든다. 질문만이 사색이 나아갈 길을 밝히고,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다. 호기심은 그 자체로 살아 숨 쉬는 존재의 이유이다. 하나의 답이 잠시 갈증을 달래줄지라도, 그 답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선 또 다른 물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물음의 꼬리가 다시 물음을 낳아 조금씩 진리에 다가가는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은,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가는 발걸음처럼 조심스럽고 끈질기다. 사색은 이성의 정원에서 피어나는 대화이면서도, 동시에 직관의 샘에서 솟아나는 감성의 영역이다. 사색의 경험이 쌓일수록 직관
- 강석화 시인(한국예총 서천지회장)
- 2025-12-26 20:13
-

칼럼 [강석화의 소중한 이야기] 귀 빠진 날의 단상
생명의 탄생을 귀가 빠졌다는 것으로 상징화하는 것은 매우 재미있는 표현이다. 과문한 탓에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표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선조들은 출생의 타이밍을 귀가 빠져나온 시점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출산 과정에서 귀가 빠져나올 무렵은 태아의 신체 대부분이 아직은 모체 안에 있을 때이므로, 따지기 좋아하는 이들은 이를 두고 정확한 기준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실제로 요즈음의 법률적 해석에 따르면 모체와 태아가 분리되는 시점을 출생의 시기로 보는 것이 통설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왜 옛사람들은 귀빠짐을 출생으로 간주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급한 성격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다. 오히려 그 반대로, 옛 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여유롭고 너그러운 사고체계를 가졌기에 귀가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생명의 탄생을 인정한 것이 아닐까? 바깥세상의 온갖 소리가 아기에게 전달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되는 순간에, 그 생명을 인격체로 대해주는 넉넉한 마음 씀씀이가 ‘귀빠진 날’이라는 발상에 함축되어 있다. 옛사람의 인본적 사고(思考)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귀가 빠지기 훨씬 이전, 그러니까 모체가 수태할 때부터 우리 민족은 나
- 강석화 시인(한국예총 서천지회장)
- 2025-11-23 18:13
-
1
[정가 소식] 국힘 서천당협, 설맞이 반공 오열사 묘역 환경정화·참배
-
2
군, 문헌서원 스토리텔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등 20일 충남 서천군 군정소식
-
3
군, 2026년 제7회 ‘생각대로 톡(Talk)’ 공모전 개최 등 19일 충남 서천군 지역소식
-
4
교육지원청, 특별한 교육과정 본보기학교 워크숍 개최 등 19일 충남 서천군 기관소식
-
5
서천도서관, 2026년 상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등 20일 충남 서천군 교육소식
-
6
보령해경,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 시행 등 20일 충남 서천군 기관소식
-
7
장항읍, 봄철 산불 예방에 총력… 감시원 교육 진행 등 23일 충남 서천군 지역소식
-
8
군, 농업인 월급제 본격 시행 등 23일 충남 서천군 군정소식
-
9
한산면, 봄철 산불유급감시원 안전보건교육 진행 등 24일 충남 서천군 읍면소식
-
10
교육지원청, 2026학년도 학교폭력통합지원센터 위촉 등 24일 충남 서천군 교육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