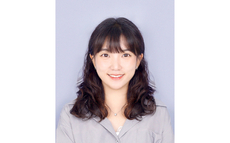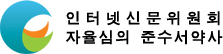어떠한 말은 흘러가고 사라지지만, 어떠한 말은 문자처럼 마음에 박힙니다.
3월 초, 시인이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말 같았습니다.
제 이름자 바로 옆에 있는 시인이라는 글자를, 감히 시라고 불리는 제 글을 의심하였습니다.
의심은 마냥 해무와 같아서 주변의 것들을 지워버립니다.
오로지 출렁이는 바다와 배 한 척만 남깁니다.
의심이 제게 남긴 것은 오직 불확실한 정체성과 미진한 시 세 편이었습니다.
시인이라면 어떤 시를 써야 하는지, 나의 시가 그토록 선망하던 시들 사이에 있어도 되는지. 차라리 앞으로는 시를 쓰지 않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지.
자욱하던 해무를 걷어버린 것은 느닷없는 딸의 단언이었습니다.
‘엄마는 시인 엄마지!’라는 42개월 딸의 말이 문자처럼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제서야 와닿았습니다. 이름자 바로 옆에 시인이라는 글자를 의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 다니며 임신과 출산을 ‘생명의 신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실제로 그 과정을 겪으며 임신과 출산을 예쁘게도 포장해 가르쳤구나 생각했습니다.
출산의 순간에, 또 출산 이후 바뀐 몸을 마주하며 대체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야 ‘생명의 신이’라는 케케묵은 포장지를 애틋하게 바라보려나 조소했습니다.
막 태어나 품에 안긴 아이는 뜨거웠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머리카락이 빼곡한 정수리가 보였습니다. 헐떡이는 정수리, 앞숫구멍만이 보였습니다.
이제 이름 석 자로 불리던 시간과 별개로, 000 보호자나 000 엄마로 불리는 시간이 썰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엄마를 부르는 게 편한 저인데, 엄마로 불린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몇 번을 더 살아도 저는 우리 엄마 같은 엄마가 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무서웠습니다.
갓 지은 밥을 차려주고도 안 먹으면 또 다른 음식을 줄지어 내놓던 엄마.
결국은 잘 먹지 않는 딸을 위해 늦은 아침마다 깨죽을 끓이던 엄마. 차림새가 단정해야 한다며 아침마다 다림질을 해 옷을 입혀주던 엄마.
한 땀 한 땀 머리를 땋고, 가장 예쁜 머리끈을 채워주던 엄마. 무엇이든 부족함 없이, 아니 더하게 보살펴준 엄마.
내가 겪은 엄마 같은 엄마가 되어줄 수 없을 것 같다는 마음과 엄마라고 불리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터져 나오던, 그 속절없는 순간에 쓴 시가 등단작인 ‘앞숫구멍’이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엄마에게 받은 건 또 받는 건 화수분인데, 막상 딸에게 하는 건 터럭입니다. 지금은 단념했습니다.
나는 엄마 같은 엄마가 되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깨가루를 물에 개어 깨죽을 끓여보았습니다.
덩어리지지 않게 개어가는 것도, 소금과 설탕을 약간씩 넣어 간을 보는 것도, 적당한 농도로 졸여나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겨우 만들어 낸 깨죽은 깨맛이었습니다. 엄마의 깨죽이 아니었습니다.
늦은 아침까지 불 앞에 서 있는 일은 딸의 시간을 살리고 엄마의 시간은 죽이는 선택이었다는 것이었다는 것을, 엄마가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몇 번을 따라해도, 엄마의 깨죽처럼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쁜 아침 흘러가는 시간에 대한 조급함도, 몸에 좋다는 음식은 먹지도 않고 결국은 찾는 게 깨죽이라는 속상함도, 그 무엇 하나 저는 넣을 수 없으니 말입니다.
딸의 단언을 듣고 며칠 후 엄마를 만났습니다. 엄마가 시를 몇 번이나 읽었는데 정말 좋더라고, 정말 잘 썼더라고 말하셨습니다.
이상합니다. 흘러가 사라져 버리길 바라는 말들은 엄마의 가슴에 잘만 새기면서, 문자처럼 엄마의 마음에 박히길 바라는 말은 도무지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낯간지러움을 감추느라 꼭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 품에 안긴 딸의 앞숫구멍보다 제가 안겨 버릇하던 엄마의 품이 더 많이 생각나 자책하며 쓴 시로 시인이 되었다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고생이던 시절 가슴을 터놓으려 썼다던 엄마의 시를 물려받은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깨죽을 먹고, 당신의 시간을 갉아 먹고 이렇게 커버렸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죽이는 줄도 모르고, 당신의 깨죽을 먹는 시간이 그렇게나 좋아했더라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실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당신의 어떤 음식보다도 오로지 나를 위한 음식이었던 깨죽이라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