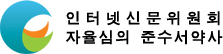가을에 대해 푸념하던 날을 뒤로 하고, 맹렬한 서늘함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겨울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바람을 어디에 두고 걸어야 하는가’를 고심하곤 합니다. 바람을 맞서 걸으면 더 춥지만,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바람을 등지고 걸으면 덜 춥지만, 종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이끌려 갑니다. 삶의 주체로 걸음하는 것과 주도권을 잠시 넘기는 것,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기 일쑤입니다. 대체로는 세상의 관념대로 삶의 주체로서의 행동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리라, 단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을 맨몸으로 맞닥뜨리며, 세상의 관념과 다른 운명의 관용을 경험하였습니다. 삶은 의지대로 되지 않을 때가 수두룩한 법입니다.
그때마다 번번이 주체로서의 자신을 의심하는 일이야말로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종래에는 종종 주도권을 이양하는 것이야말로 운명이 내게 베푸는 관용이 아닐까, 하고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거대한 짐승마저 동면에 드는 겨울이라면, 왜소한 인간 또한 휴양에 드는 것이 섭리일 것입니다. 운명의 관용을 당연시 여겼을 때야, ‘부단히 애쓰는 것,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최고선이라 외치며 사람들을 각성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 각성은 세기를 건너 마침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억센 그 각성은 멈춤을 죄악으로 여기고, 속도를 미덕으로 추앙하는 이 시대의 맹목을 잉태했습니다. 쉼은 나태로 오해받을 뿐, 운명의 관용은 사람들 눈에 좀처럼 띄지 않는, 모래 속에 잠긴 사금이 되었습니다.
모든 계절은 전진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멈춤 또한 삶의 일부이며, 고요 역시 의지의 한 방식이라는 사실을 겨울은 품고 있습니다. 쉬어감은 나태가 아니라 균형이며, 느림은 포기가 아닌 다른 형태의 성실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감상에 닿으니, 몇 해 간 이어오던 고민이 사뭇 달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만큼은 앞선 시간으로부터 한발 물러나, 과거의 리듬과 감각을 더듬으며 삶의 결을 되돌려 보고 싶어졌습니다. 운명의 관용에 감사하며, 애써 바람을 가르기보다 바람의 결을 따라 숨을 고르며 지나가는 연습을 하고자 합니다.
추위가 더해갈수록 땅속 깊이 몸을 묻고 온전히 겨울을 마주하는 무 한 뿌리를 떠올립니다. 사늘한 흙 속에서 바람의 흐름에 따라 더욱 단단해져 가는 무 한 뿌리는 위안이 됩니다.

느리게, 달큰하게 속을 채우며 자라난, 겨울을 온몸으로 입은 무 한 뿌리가 겨우내 우리를 먹여 살립니다. 서늘함을 고스란히 품고 견뎌내는 동안, 무의 속살은 더욱이 고요하고 깊은 맛을 켜켜이 쌓아갑니다. 김장철이 다가오면 마트 이곳저곳에는 배추와 무가 한가득 놓입니다.
유난히 묵직하고 단정한 겨울 무 한 뿌리를 고릅니다. 겨울 이슬과 엉겨 얼어붙은 흙덩이들을 털어내면 잔뿌리가 성기게 붙은 하얀 밑동이 드러납니다. 그 위로 박힌 티끌 같은 흙 알갱이는 거친 겨울 땅의 가보일지도 모릅니다.
두 손 가득 무를 쥐면 손바닥 안으로 서늘한 기운이 전해집니다. 초록 우듬지와 무청은 아직도 한 계절의 생명을 기억하는 듯 싱그럽게 고개를 듭니다. 길게 뻗은 무청의 결을 따라가다 보면, 간간이 피어올랐을 햇볕 한 줄기가 어렴풋이 보여옵니다.
무 껍질을 듬성듬성 벗깁니다. 하얀 밑동에 가까운 부분은 뭇국으로, 연두 우듬지와 초록 무청은 동치미로 겨울의 양식이 됩니다. 한껏 찬 기운을 받아낸 무는 오히려 달아진다는 것이 기특하다가도, 제 안은 얼마나 곪았을까 안쓰러워집니다. 어느 한구석 버릴 데 없는 겨울 무라지만, 더욱이 정성을 들입니다.
은근히 오래도록 끓인 뭇국은 겨울이 가진 가장 조용한 온기를 드러냅니다. 혹독한 냉기의 시간을 거친 동치미는 겨울 새벽녘의 맑은 숨결을 닮아갑니다. 더한 재료 없이, 무는 겸허히 자신을 겨울 속에서 익혀냅니다. 겨울에 모든 것을 맡기고, 끝내 자기 맛에 도달하는 무의 시간은 계절이 주는 가장 단정한 가르침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인지 겨울철 한 그릇의 뭇국은, 우리에게 적막한 숨결을 달래는 따뜻한 품이 되어줍니다. 겨울철 한 사발의 동치미는 우리에게 잠시 숨을 고르게 하는 맑은 침묵이 되어줍니다. 뜨거움과 차가움을 오가는 한 숟갈과 한 모금은, 겨울을 나는 가장 조용한 방식이 됩니다.
누구도 재촉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 운명의 관용은 한 겹 눈꺼풀 뒤에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자그마한 씨앗 한 톨은 흙 속에서 덤덤히 겨울을 보내며, 자기보다 큰 생을 살려냅니다. 하얀 입김이 우거진, 겨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