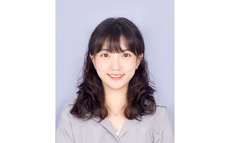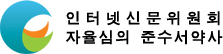새해의 첫 절기가 봄의 입구에 듭니다. 드디어, ‘입춘’입니다. 옛날에는 입춘을 열심히도 기렸다고 합니다.
그날 한 해의 대길(大吉)과 다경(多慶)을 기원하려 수많은 의례를 베풀었습니다. 희끄무레한 흔적만 남기고 나달나달 지나간 세월 속에, 현시적인 의례는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상들의 숨결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일까요.
입춘이라는 두 글자만으로도 한 해가 양지에 들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입춘대길 건양다경(立春大吉 建陽多慶)을 입안에서 굴려 보며, 우리는 드러나지 않는 의례를 이어갑니다.
담쟁이는 작은 손을 잡고선 벽을 타고 오르는 숙명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입춘을 고대하는 것은 어쩔 도리 없는 우리의 숙명입니다. 우리는 양지에 몸을 누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너울거리는 강물에서 헤엄치기 시작한 연어는 광활한 연안으로 떠납니다. 휘몰아치는 파도와 요동치는 지느러미가 자신의 정체성이라 여기게 될 즈음, 연어는 잔잔한 강물에서 파닥이던 꼬리를 기억해 냅니다.
연안이 아닌, 강물에 자신의 정체성이 있음을 깨닫고, 연안으로부터 거슬러 강을 오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격랑의 시간을 거치면 가슴에 녹슨 훈장이 몇 박힙니다. 세찬 장마에 젖어 축축이 헤져가는 상처 한 겹, 마른 바람에 말라 바싹 찢겨가는 상처 한 장, 짙은 어둠에 묻혀 푹푹 잠겨가는 상처 한 점이 몇 번이고 박힙니다.
그 무거운 것들을 가슴에 지고도 사는 것은, 삶이 희끄무레하게 남긴 따뜻한 봄볕 몇 줄기 덕분입니다. 볕으로 인해 바래어 간 추억 몇 편이 우리를 먹여 살립니다.
그 따사로운 볕이 몹시 그리워 우리는 몇 번이고 거스릅니다. 젖고 헤진 몸, 마르고 찢긴 몸, 어둠에 잠긴 몸을 다시 양지바른 곳에 누이고 싶은 것은 당연한 숙명인 것입니다.
다만, 입춘은 꼭 겨울 끝자락에 달려 있습니다. 봄 햇살을 머금어볼까 하다가도, 겨울 바람결에 얼굴을 묻어버립니다. 그렇기에, 입춘 거꾸로 달았냐는 속담도 있는가 봅니다.
입춘은 겨울 문틈으로 발가락만 살짝 걸쳐두고는 언제쯤 들어가야 하나 기웃대는 듯합니다.

마치, 얼얼한 흙 위로 살짝 나온 봄동 같습니다. 중천 볕을 쪼이며 흙 사이 사이에 있을지 모르는 봄기운을 찾으려, 바짝 엎드려 엉금엉금 기어 나오는 봄동 말입니다.
그러니 하는 수 없습니다. 따뜻함을 기다리는 우리가 아쉬운 쪽이니, 문 쪽으로 고개 돌린 채로, 언제쯤 들어오는 게 좋은지 함께 망을 봐야 합니다.
그게 어렵다면, ‘입춘대길 건양다경’ 흥얼거리며 봄동처럼 바짝 웅크리고 발밑에 떨어진 봄의 조각조각을 찾아내야 합니다.
마음은 이미 봄으로 향하는데 몸은 아직 겨울에 있는 요즘, 저는 차라리 바짝 웅크리고 봄의 조각들을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봄이 저 문틈으로 어서 들어오길, 채근하며 망을 보는 일이 어찌나 노심초사한지요.
저에게는 얼마만큼의 날이 흘렀는지 달력을 들여다보고, 얼마만큼 따뜻해졌는지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이는 게 꽤 심란하고, 번잡한 일이었습니다.
대신 강물에서 연안으로 또 다시 연안에서 강물로 돌아갔을 연어와 겨울의 땅에서 가장 먼저 봄을 찾아내는 봄동을 다듬었습니다.
붉은 연어에서 푸른 연안의 향이 납니다. 연어가 품었을 바다를 닦아냅니다. 너른 바다를, 가파른 강물을 헤엄친 연어는 따사로운 볕을 알기는 할까, 궁금합니다.
지중해의 볕이 그렇게 따뜻하다던데, 연어는 한 번도 닿아본 적 없을 그곳의 올리브와 월계수를 이제야 마주해 봅니다. 후추와 소금, 그리고 맛술을 조금 떨어뜨려 둡니다.
올리브유를 두른 프라이팬은 금방 열을 머금습니다. 프라이팬 위에서 지중해의 향과 알래스카 연안의 맛이 타다닥, 화음을 이룹니다.
알래스카의 겨울과 지중해의 여름이 만나면 과연 봄이 될까, 허상을 그리다 보면 이윽고 연어의 겉면이 봄으로 물듭니다. 익어가는 연어 위에 물과 쯔유, 맛술, 설탕을 흩뿌리고는 약한 불에 조립니다.
그 사이 봄동은 겨울 흙을 털어내고 있습니다. 작은 씨앗 한 알이 얼어붙은 땅속에 뿌리를 내린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생각해 봅니다.
억센 바람을 피해 가며 봄기운을 찾겠다며, 흙을 어찌나 기었는지 밑동엔 모래알이, 잎엔 생채기가 가득합니다.
그러니 찬물에 맨손을 담가 몇 번이고 봄동을 씻어내도, 물속에서 봄동잎을 한 장 한 장 헹궈내도 뼈가 시리지는 않습니다.
그저, 마음이 조금 시립니다. 물기를 털어낸 봄동에는 간장, 고춧가루, 액젓, 매실을 넣어 살살 버무립니다.
몇 번이나 식탁을 차리면 바람에서도 햇살을 느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고개를 젓습니다.
봄을 기다리면 봄은 더디 오지만, 봄을 찾아내면 봄은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쨌거나, 반드시 입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