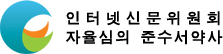구암 구병대 선생은 고종28년(1891년)에 진사에 합격하고 성균관에 들어갔다가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고 대과시험을 포기하고 고향인 시초면 신곡리에서 은둔생활을 하고 제비가 돌아온 따뜻한 봄 한가한 시간에 고향의 모습을 그리며 그동안 어지러운 세상을 잊고자 술로 세월을 보내며 자신이 병이 들었음을 말하고 있다.<편집자 주>
◯ 구암 丘秉大(구병대)선생은 고종28년(1891년)에 진사에 합격하고 성균관에 들어갔으나 과거시험 보다는 자신을 위한 학문에 힘을 쏟았으며, 宋秉璿(송병선)의 문하에 출입하여 문도들과 교유하였다.
서구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 조정은 친일세력에 의하여 일제와 1.2차 한일협약으로 국권을 뺏기는 등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고 매일같이 통한하다가 참판 閔宗植(민종식)이 홍산 지티에서 2차 홍주의병 창의 때 참여하여 홍주성을 점령하였으나 일본군대의 지원으로 실패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은둔하고 있었다.

가난한 고향에서 한가하게 쓸모없는 선비가 되어 여러 해 동안 스스로 땔나무나 하는 노비에 불과한 자신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귀영달을 바라지 않고 있지만 목표를 향해 가던 길을 포기한 것을 한스러워 하고 있다.
그러나 고향은 따뜻한 해살과 아리따운 제비가 도착한 3월 늦은 봄이다. 논밭에 봄비는 내려주고 건강한 소를 몰고 오는 풍요로운 농촌풍경이다.
구암 본인이 때때로 당뇨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병 때문에 자주 지난날을 되돌아보니 【散步東林-동쪽 산림을 걷다】 詩에서 밝힌바와 같이 ‘살아 있는 동안 마을 술집에 술잔으로 살아가겠네’라고 다짐을 한 바 있어 술 때문에 당뇨병이 생겨 고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뇨병으로 고생하다가 1916년 58세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묘지는 시초면 신곡리 선영에 모셔져 있다.
<精選 龜巖遺稿 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