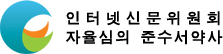여름의 끝 무렵을 짐작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새벽녘의 선선한 바람을 느끼며 여름을 고요히 배웅하는 것.
숲속 마른 흙냄새나 들판 너머 장작불 타는 냄새를 맡으며 여름의 빈자리를 직감하는 것.
노을이 점점 더 서두르며 검푸른 하늘을 발갛게 적셔갈 때, 문득 여름과의 일별을 예감하는 것.
사그라지는 매미 소리와 퍼져 드는 풀벌레 소리를 따라 한참을 헤매다가, 불현듯 여름의 종결을 깨닫는 것.
저는, 무성하게 맺힌 영롱한 무화과 송이들을 바라보며 남은 여름날을 가늠합니다. 여름의 끝 무렵을 어림하면서, 앞서 시름하기도 하지요. 여름은 심술을 부리듯, 늘 드센 비와 함께 뒷모습을 보입니다.
거센 여름의 끝자락에 선 무화과는 번번이 열과가 됩니다. 지금 저 햇살 아래 보드레한 무화과 한 알이, 폭우 속에서 끝내 열과가 되진 않을까 조마조마해하며, 여름의 마지막을 예견합니다.
암녹색으로 짙게 우거진 나무, 틈틈이 붉은 보라로 물들어가는 무화과가 자리합니다. 두꺼운 이파리는 손가락이 유난히 긴 손을 닮았습니다.
짧은 손바닥과 긴 손가락, 그 암녹색 손은 여름 볕 아래서는 제법 든든한 그늘막이 되어줍니다.
늠름한 그늘막 아래에서 무화과는 금세 검붉어집니다. 다만, 암녹색의 손은 여름비 아래에서는 왜인지 더 깊숙이 아래로 고꾸라지기만 합니다.
대차게 쏟아지는 여름의 심술입니다. 어떤 심술은 꼭 이파리에 매달려서는 고개를 떨구게만 하고, 어떤 심술은 기어이 검붉은 무화과에 실금을 내고는, 여린 속을 샅샅이 헤집으려 듭니다.
실금이 번진 검붉은 껍질 밖으로, 해끔하고도 발그레한 선홍빛이 흘러내립니다.
마냥 꽃이 아니라던 무화과는, 바로 그 열과의 순간에서야 더할 나위 없는 꽃이고야 맙니다.
볕 아래에서 무화과를 따는 일과, 빗속에서 열과를 지켜보는 일.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몇 알의 무화과는 적갈색 바구니에 보시시 담아내고, 몇 알의 무화과는 암녹색 손바닥에 그대로 맡겨 둡니다.
열매로 남는 무화과와, 꽃으로 남는 무화과 중 무엇이 더 무화과다운지를 끝내 가름하지 못한 채, 남은 여름날을 느릿하게 곱씹습니다.
바구니 속의 무화과를 꺼내어 찬물에 씻어냅니다. 빳빳하던 털들은 몇 방울 물에 금세 보드라워집니다.
손이 가는 대로 무화과를 결결이 갈라내면, 해끔하고 발그레한 향이 물씬 퍼집니다.
그릇에 담은 무화과에 메이플시럽과 머스코바도 설탕, 코코넛오일을 살며시 묻혀줍니다.

그리고, 남은 여름을 곱씹는 것만큼이나 오래도록 씹어야 할 사워도우 빵 위에 무화과 속살을 닮은 리코타 치즈를 발라냅니다.
치즈 위에 달큰한 무화과잼을 겹겹이 덧바르니, 하얗고 포슬한 치즈 위로 붉고 진득한 잼이 흘러내립니다. 그 위에, 준비한 무화과를 차곡차곡 쌓아 올립니다.
오븐이 돌아가는 소리, 빵이 익어가는 향기 속에서도 여름의 끝 무렵은 어딘가로 향해갑니다. 곧 비가 쏟아진다는 예보처럼, 창밖으로는 구름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무화과의 끝이 흙갈색으로 빛납니다.
흰 접시 위, 농밀한 향과 윤택한 태가 도드라집니다. 무화과 사워도우를 한입 크기로 잘라 입에 넣습니다.
질긴 적갈색의 테두리가 유난히 말썽이지만, 그만큼의 노고로 더욱이 고소해지는 것이라 수긍해 봅니다.
달콤한 무화과, 담백한 리코타치즈, 고소한 사워도우. 마지막 한 입을 떼면 머지않아, 암녹색 손이 지키고 있는 무화과는 곧 열과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여름을 매듭지을 요량으로, 천천히 무화과 사워도우를 음미합니다.
“I saw my life branching out before me like the green fig tree in the story. From the tip of every branch, like a fat purple fig, a wonderful future beckoned and winked.”(『The Bell Jar』(Sylvia Plath))
삶은, 어떤 무화과를 바구니에 담았는지, 또 어떤 무화과를 암녹색 손에 남겨두었는지를 잊을 만큼이나 드세고 거세며, 그만큼이나 안온하고 아늑합니다.
삶에서의 선택은 망설임 속에서는 유예되고, 확신 속에서조차 유랑합니다. 무화과를 맛보거나 무화과꽃을 마주하기 전까지는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고민하고 시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구니에 담긴 열매와 암녹색 손에 맡긴 열매 중 “무엇이 더 ‘무화과다운가’”를 묻는 일은 이제 더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뿌리가 흙을 파고드는 한, 가지가 하늘에 솟구치는 한, 무수한 여름이 기다리는 한, 이 모든 무화과는 그저 매 여름의 끝 무렵을 차지하는 무화과일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