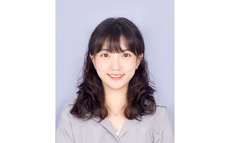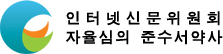낮이 길고 무더운 계절이자 그림자가 짙고 짓궂도록 변덕스러운 계절, 여름. 여름의 옛말은 ‘녀름’이었습니다.
식물이 가까스로 자라 맺는 결실이자 생명을 먹이고 키워내는 과실, 열매. 열매의 옛말은 ‘여름’이었습니다.
대학생 시절, 중세국어를 배우며 그들 사이에 필연을 부여하곤 했습니다. 여름과 열매, 녀름과 여름. 제게는 그 상관관계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여름의 열매, 매실, 토마토, 복숭아, 수박, 포도, 블루베리, 자두, 참외, 복분자, 멜론, 옥수수. 떠올리기만 해도 다채로운 그 맛들은 실로 여름이었습니다.
그 관계에 ‘여름의 여름’이란 이름을 붙이고는 곱씹던 날들이었습니다. 여름의 열매인지, 열매의 여름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무턱대고 제멋대로인 계절 속에서 빚어진 과실이라는 것이 그저 좋았습니다. 과실을 열심히도 빚어내느라 무턱대고 제멋대로일 수밖에 없는 계절이라는 것이 마냥 좋았습니다. 무적의 여름들.
여름을 입에 머금고 있으면, 볼 안의 마음은 양달에 놓인 양 익어갑니다. 입 속의 혀는 응달에 놓인 양 식어갑니다. 이토록 뜨겁고도 서늘한 것이 여름입니다.
뜨겁기 때문에 서늘한 것인지, 뜨겁기 위하여 서늘한 것인지. 서늘하기 때문에 뜨거운 것인지, 서늘하기 위하여 뜨거운 것인지.
그 무엇도 적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여름의 여름이 낳는 모든 것은, 분명히 새콤하고 달콤하며 청량하고 진득합니다. 이름하여 여름입니다.
내내 여름의 여름에 머물며 보내고 싶었습니다. 여름의 여름을 보내는 방법은 두 가지라는 생각에 다다랐습니다.
보낸다는 것은 결국 하나, 여름의 여름을 지켜내는 것과 둘, 여름의 여름을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고심한 여름의 여름을 나에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오늘의 여름을 내일의 나에게, 모레의 나에게, 나중의 나에게, 결국은 이 여름 끝의 나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유리병에 여름의 여름을 가득 채워두고, 매일 조금씩 꺼내 먹는 것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는 방법인 듯했습니다. 토마토 츠케모노와 복숭아 콩포트.
끓는 물에 유리병을 한소끔 삶아 식혀줍니다. 깊은 채반에 자박자박 물을 채워 토마토와 복숭아를 씻어냅니다. 토마토 츠케모노를 먼저 만들기로 합니다.
토마토 끝에 얕게 십자 모양 칼집을 내줍니다. 끓는 물에 잠시 담갔다가 찬물에 옮겨 담습니다. 엄지 손가락 아래로 방울토마토의 얇은 껍질이 밀려 내려옵니다.
유리병에 방울토마토와 바질잎을 놓아가며 층층이 쌓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차가운 매실액과 레몬즙을 섞어 부어줍니다. 새콤하고, 달콤한 여름의 여름이 준비되었습니다.

단단한 복숭아의 껍질은 과도로 얇게 벗겨냅니다. 물렁한 복숭아의 껍질은 엄지손가락으로 살살 문질러 벗겨냅니다. 달콤한 향이 퍽 여름입니다.
손가락을 타고 흐르는 진득한 즙에 괜시리 알딸딸해집니다. 복숭아를 잘라 냄비에 가득 담습니다. 갈색 원당과 라임즙이 복숭아 사이 사이를 메워갑니다.
한소끔 끓이고 졸입니다. 얼그레이 찻잎을 살짝 흩뜨립니다. 유리병에는 금세 하얀 김이 서립니다. 하얀 김에는 여름의 향이 고스란히 배어있습니다. 청량하고, 진득한 여름의 여름이 준비되었습니다.
유리병의 뚜껑을 닫아 냉장고에 넣으며, 비로소 여름의 여름을 보낼 준비를 마칩니다. 여름을 입에 머금으며, 변덕스러운 여름날과 다채로운 여름맛을 몇 번이고 녹여냅니다.
여름의 여름은 그렇게 나에게 스며들어, 무적의 나를 만들어 낼 것이라, 주문을 걸며 여름을 또 한입 가득 머금을 것입니다.
유리병 속 공간은 점점 비어갑니다. 여백을 채워가려, 더욱 짙어지는 향입니다. 어쩌면, 여름의 여름 그 끝에서 얼마 남지 않은 열매를 헤아리며 아쉬운 대로 유리병에 코를 묻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리병에 머무는 만큼 향이 남는 것이라면, 여름의 여름에 지겹도록 머물러 제 향을 남겨야겠습니다. 무적의 여름에 지지 않고 무탈히 지냈다고, 무적의 여름에 의지하며 무사히 보냈다고 말입니다.
“Au milieu de l’hiver, j’apprenais enfin qu’il y avait en moi un été invincible.”(In the depth of winter, I finally learned that within me there lay an invincible summer./한겨울 속에서, 나는 내 안에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여름이 있다는 것을 마침내 알게 되었다.) 알베르 카뮈(Albert Camus)의 수필 「Retour à Tipasa (티파사로의 귀환)」(『L'Été』(1954))에 나오는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리도 황홀한 여름은, 누구에게나 여름인가 봅니다. 한 번쯤 이름 붙이고 싶은 그런 ‘여름의 여름’인가 봅니다.